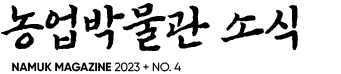웹진 본문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박물관의 유물, 체험, 교육 등을 소개해 즐길 거리를 더욱 풍부하게 보여드립니다.
탈곡기도 없던 시절의 농사 연장,
개상

그림 1. 개상
가을이 깊어가면 산천이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다. 산야에서 단풍이 가장 먼저 드는 곳은 흥미롭게도 벼가 익어가는 들판이다. 푸르던 들판이 누런 황금 들판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면 농부들의 몸과 마음은 바빠진다. 황금 같은 벼는 때맞춰 추수를 하고, 가을 햇살에 잘 말린 후 탈곡을 하여 집안으로 들인다. 바쁜 가을걷이로 농부의 손은 거칠어지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넉넉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콤바인으로 벼 베기와 탈곡 작업을 한꺼번에 해치운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콤바인이 있기 전에는 경운기에 탈곡기를 부착하여 타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발로 밟아서 돌리는 탈곡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더 이전에는 홀태, 탯돌, 그네, 천치千齒 등의 연장이 있었다. ‘개상’도 그런 전통 사회의 도구 중 하나이다.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 중 벼타작 그림은 개상을 이용해 벼를 타작하던 옛날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김홍도, 《단원풍속도첩》 벼 타작,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 개상

그림 3. 개상
개상은 나락을 메어쳐서 이삭을 떨기 위한 상床 형태의 탈곡 연장이다. 간단히 태질을 위한 상 모양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상 형태인 만큼 네 개의 다리가 있고, 그 위에 상판이 있는 구조다. 개상의 다리는 태질하기에 알맞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설치하였고, 태질에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고정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판은 음식을 놓는 곳이 아니라 볏단을 태질하는 용도이기에 메어치기 좋도록 통나무를 그대로 이용한다.
큰 통나무를 사용한 경우는 그림 1과 그림 2처럼 켠 통나무 하나만으로 상판을 만들 수도 있고, 가는 통나무의 경우 그림 3처럼 여러 개를 하나로 결합하여 만든다. 농사 규모가 크면 나락도 많아 여러 사람이 울력으로 함께해야 하기에 그림 1과 그림 3처럼 상판을 길게 만들고, 필요에 따라 그림 2처럼 짧게 만들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 2는 중간 부분이 우묵하게 파졌는데, 오래 사용하여 닳은 모양새다. 대를 이어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처럼 제작에 정성과 노력을 들인 것도 있지만, 간단히 긴 통나무 자체를 이용해 받침돌만 괴어 다리 없는 상태로 사용하는 예도 흔하였다. 더욱 간단히는 절구통을 개상 대신 사용하며, 간혹 나무절구나 돌절구를 뉘어 놓고 태질을 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벼 타작 방법에는 이삭에 붙어 있는 낟알을 훑는 것과 떠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훑는 도구가 홀태이다. 떨어내는 연장에는 탯돌이나 개상이 있다. 오늘날의 탈곡기나 콤바인은 모두 떨어내는 원리를 이용한 기계다.
개상을 이용해 타작할 때는 먼저 타작마당을 준비해야 한다. 개상질로 타작하게 되면 곡식의 낟알이 이리저리 튄다.
타작을 마친 후에는 흩어진 곡식들을 쓸어 모아야 한다. 이때 마당에 흙이나 모래 등이 있다면 곡식에 섞인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타작 며칠 전에 진흙을 개어서 마당을 말끔하게 바른다.
이를 ‘마당맥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마당맥질을 한 다음 타작하면 모래나 흙이 거의 섞이지 않는다. 그리고 개상질을 위해서는
볏단을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자리갯줄로 단단히 묶어야 메어치기가 좋다. 타작은 대개 마을 사람들이 울력으로 하였으며 일꾼들은 앞소리를 메기고 뒷소리를 받으면서 개상질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기계식 탈곡기가 보급되면서 개상질은 타작마당에서 서서히 사라져 갔다. 더불어 관련 용어나 말들도 함께 잊히고 있다.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경직도》 중, 탈곡하는 장면